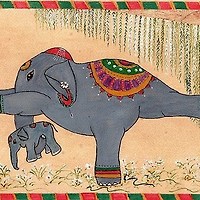티스토리 뷰
오늘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초여름의 조각을 주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설명해달라고 누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답해줄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입수했다. 이 '초여름의 조각'이란 것은 참으로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애써서 설명을 해보자면 천천히 달리는 차창에 우연히 회색의 돌담과 그 담을 반쯤 덮은 담쟁이 덩굴이 보이는 순간의 느낌 같은 것이다. 봐라. 애초에 내가 그래서 설명하기가 난감하다고 한 것이다. 블루레이 디스크에 1테라 정도 용량의 햇살을 담아오지 않는 한 충분히 상대에게 초여름의 조각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과감하게 초여름의 조각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자.
우리는 방금 전에 초여름의 조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다. 물론 내가 얘기한 순서는 반대지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신경쓰며 살지 말자는 취지에서 우리는 합의한 것이니, 합의의 정신을 충실히 되새겨주길 바란다.
초여름의 조각은 내 호주머니에 담긴 채(왼쪽이었던 것 같다) 홍대와 연남동 사이의 거리를 걸어다녔고, 지금은 내 집 안까지 들어와 이 글을 쓰는 테이블 옆에 놓여 있다. 초여름의 조각을 주운 것까지는 참 좋은데, - 역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좋다 - 이 녀석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신이 좀 더 친절했다면 분명 매뉴얼을 함께 주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신은 별로 친절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일단 초여름의 조각과 대화를 시도해봤다.
"당신은 초여름의 조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음... 역시 그렇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그렇게 끝나버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나는 학교에서 초여름의 조각과 만났을 때의 예의바른 대화법 같은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곤란해 하는 나에게 초여름의 조각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초여름의 조각일 뿐입니다. 초여름 그 자체도 아니고, 겨우 조각일 뿐이죠. 그런데 당신은 뭡니까?"
"저는 저라는 사람의 조각입니다. 저 자체가 아니고, 겨우 조각일 뿐이죠."
"재밌군요. 우리는 모두 조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조각 동지!"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신기했다. 초여름의 조각은 그런 인간적인 예법을 대체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 속으로 조용히 상상했다. 초여름의 조각이 사는 세계에 대해. 그 세계의 한 쪽 귀퉁이에 '인간적인 예법을 가르쳐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둔 학원이 있다. 초여름의 조각들은 조용히 그 학원에 앉아 악수와 인사, 차례 지내는 법, 서양식 포크 쥐는 법 등을 배우고 있다. 그 풍경은 마치 벚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초록잎이 돋아나는 모습과 같다. 즉, 아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은밀한 풍경이란 뜻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상상 속으로 걸어들어가 인간적인 예법을 가르치는 학원의 문을 밀었다. 그리고 내가 주운 초여름의 조각이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마주보며 앉았다. 초여름의 조각이 빙긋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파스타를 포크로 동그랗게 말아쥐는 연습을 하며 창 밖을 바라봤다. 창 밖에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주 투명한 것이었지만 완전히 안 보이지는 않는. 분명히 저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초여름의 조각은 나에게 이런 순간에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인간적인 예법의 궁극적 경지라고 충고했다. 나는 충고에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곳은 초여름의 조각들이 사는 세상이지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너짐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가 다 무너지고 나면 다음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차례로 차례로 무언가가 무너졌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어쩌면 아무 것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예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편이 나에게도 초여름의 조각에게도 무난한 삶을 제공할 게 틀림 없었다. 나는 파스타를 포크로 둥글게 말아쥐는 법을 마스터한 뒤 학원의 문을 나왔다. 그리고 상상 속의 세계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초여름의 조각은 아직 상상 속의 세계에, 그 세계의 인간적인 예법을 가르치는 학원에 머물러 있었다. 수 많은 창 중의 하나에 초여름의 조각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세계는 대체 어디인가. 분명 들어가기 전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던 초여름의 조각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줄 알았다면 나는 아무 것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또 한 가지가 무너져 내렸다.
- End
2016. 5. 17. 멀고느린구름.
'소설 > 짧은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로의 조각 (0) | 2018.04.04 |
|---|---|
| 다운펌 전도사 (2) | 2017.06.27 |
| 내 육체야 자네들 맘대로 죽이지만 | 항일 아나키스트 박열 (0) | 2015.11.27 |
| 그래도 나는 영원히 그대들 편에 | 의병장 신돌석 (0) | 2015.10.02 |
| 곁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는 별빛이어도 | 옥산 이우 (0) | 2015.09.27 |